보리 출판사 블로그
김민주
보리에서 펴내는 부모님 책 <개똥이네 집> 2011년 2월호
'영화를 보니' 꼭지에 에 실린 글입니다.

반가웠다. 우리한테 익숙한 '착한 놈'과 '나쁜 놈' 대결 구도가 아닌, '나쁜 놈'과 '나쁜 놈'이 벌이는 드잡이질은 우리 나라 영화에서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영화 속에 믿고 응원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도 없을 때, 관객은 작품을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
통쾌했다. 그 나쁜 놈들이 바로 '경찰'과 '검찰'이었기 때문이다. <부당거래>는 사회 비리를 영화로 고발하겠다는 감독 의지가 도드라지는 영화다. 승진에 눈이 먼 최철기 형사(황정민 분)와 태경기업 김 회장이 뒤를 봐주는 주양 검사(류승범 분)는 우리 시대 공권력을 대표하고, 최 형사 쪽에 붙어서 잇속을 차리려던 해동건설 장석구 사장(유해진 분)은 기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공권력과 기업이 서로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에둘러 말하지 않고 곧바로 보여 준 것이다.
물론 <부당거래>에 담긴 고발이 새롭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거래들은 그다지 은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권력자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더러운 관계들을 뻔히 알고 있다. 영화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찰 스폰서 문제를 엠비씨(MBC) 'PD 수첩'에서 다루었을 때 시청자들이 통쾌해했던 까닭은, 아예 모르던 문제를 새로 알게 되어서가 아니라 이미 짐작으로 알던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데에 있다. 방송을 통해 크게 화제를 모았는데도, 몇몇 말단 검사들이 사퇴하고 구속되는 걸로 얼버무려진 가벼운 처벌은, 이 집단이 해 온 부당 거래가 얼마나 뻔뻔한지를 잘 보여 준다.
문제는 이 뻔뻔한 부당 거래가 반드시 경찰이나 검찰, 또는 기업처럼 힘있는 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 어두운 거래는 뻔뻔한 표정을 감추고 교묘하게 미소를 지으며 평범한 소시민들 일상에도 손을 뻗친다. 시민들은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바라든 바라지 않든, 저도 모르게 정당하지 않은 뒷거래에 휩쓸리고 만다.
이를테면, 우리는 기업 누리집에 가입할 때만 해도 기업에 개인 정보를 내주어야 한다. 법에서나 쓰는 어려운 말들이 길게 적힌 약관에는 개인 정보가 기업 이익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 자체가 되지 않아서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비리를 저지른 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기업은 자신들 상품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웰빙'이라는 이름으로 광고하며 소비자를 유혹한다. 이 유혹은 엄밀히 말해 강요에 가깝다.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휴대전화 광고에서 스마트폰이 아닌 제품은 전혀 찾을 수 없다. 마치 이 시대에 구매할 수 있는 휴대 전화는 스마트폰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제품을 쓰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곧 사회가 어떤 재화를 광고나 그밖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 소비자들은 대부분 자기로 모르게 그것을 사들이고, 그때 기업이 가진 도덕성은 크게 따지지 않는다.
주양 검사가 현장에서 즉흥으로 했다고 알려진 대사 한 마디가 있다. "참 열심히들 산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들은 참 열심히들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아 봤자 정작 부패한 자들이 쳐 놓은 덫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대로라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그자들이 요구하는 부당 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끔찍한 현실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도, '사회 정의'를 위해 애쓴다는 검찰도 믿을 수 없는데 말이다. 언론은 어떨까? 앞서 말한 'PD 수첩'처럼 고발성 짙은 프로그램이라면 '사회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부당거래>에서도 언론은 꽤 비중 있게 다뤄지는데, 이때 언론이 보이는 태도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영 다르다. 영화 속에서 언론은 경찰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가짜 범인을 붙잡아 만든 '쇼'를 크게 보도하고, 경찰과 검찰한테 매수되어 그이들 입맛에 맞는 기사를 꾸며 낸다. 이것은 영화가 꾸며댄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정권이 들어선 뒤로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인사 발령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요즘 들어서는 종합편성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에 주류 신문사한테만 특혜를 주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존재는 경찰도, 검찰도, 언론도 아니다. 그럼 누굴까? 영화에서 제시한 해답은 바로 '1인 미디어'이다. 영화 속에서 사건을 뒤집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디지털카메라, 휴대 전화와 같은 미디어 도구였다. 우리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으며,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하여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한 덕택에 온라인 민주주의 힘이 강해졌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런 말에 온전히 동의하기엔 세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는 미디어 도구 역시 자본주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인터넷 서비스는 거대한 권력 속에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은 '트위터'를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 문제가 큰 소동을 일으키자 곧 바로 중국 서버에서 '트위터'에 접속할 길을 막아 버렸다 한다. 셋째는 미디어 도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올바르게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영화 속에서 해동 장석구 사장이 최철기 형사 약점을 잡으려고 통화 내용을 녹음했던 것처럼 말이다. 미디어 도구는 말 그대로 '도구'일 뿐이다. 이 도구가 참된 목적에 맞게 쓰이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과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부당거래>는 그동안 우리는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찰, 검찰, 언론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당거래'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우리한테 있다. 때로 뻔뻔하게, 떄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부당한 거래 관계에서 벗어나기에 이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는 너무나 바쁘지만, 세상을 보는 바른 눈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삶과 양심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글쓴이 김민주
영화와 사회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가끔은 직접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한다.
지금은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졸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전문사(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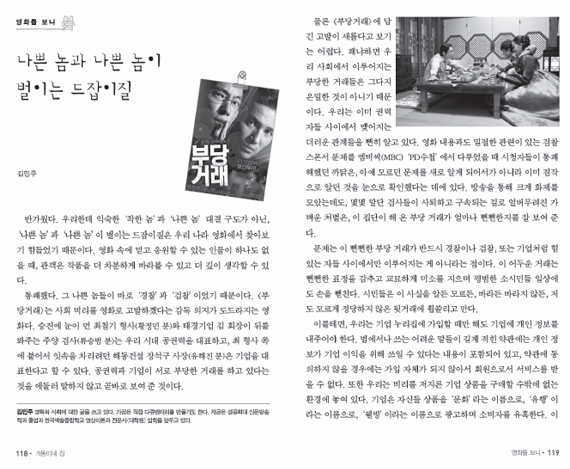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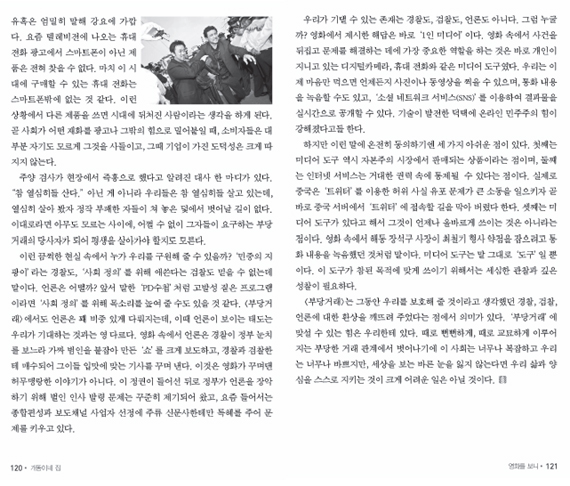









댓글을 남겨주세요
※ 로그인 후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