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 출판사 블로그

이오덕 선생님이 쓴 시를 보면 어린이들이 겪는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쓴 시도 있고, 사람들이 짐승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마음을 쓴 시도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 시도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직접 보고 들은 모습에 깊은 마음을 담아 시로 쓰셨습니다. 그만큼 둘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보고, 잘 듣고, 깊이 생각하면서 사셨던 것이지요.
어느 늦은 가을, 충주 무너미에 있는 선생님 집에 갔을 때입니다. 선생님 방에 들어가니 창틀에 감나무 잎을 주욱 늘어놓았어요.
"선생님, 웬 나뭇잎을 주워다 놓으셨어요?"
"그거? 감나무 잎이에요. 새벽에 감나무 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어찌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떨어진 감나무 잎이 저렇게 곱고 예뻐요. 그래서 몇 장 주워왔어요."
선생님이 사시던 돌집 마당 끝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 잎이 새벽에 떨어지는 소리를 방안에서 들어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새벽빛을 머금은 감나무 낙엽이 너무 아름다워 몇 장 주워서 창틀에 놓고 보신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밖에 자주 나갈 수가 없으시니까 나간 길에 몇 장 주워 오신 것 같았어요.
"벌레 먹은 잎도 있네요?"
"그럼요, 벌레 먹은 감나무 잎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한 잎도 예쁘지만 벌레 먹은 잎도 참 예뻐요."
어느 겨울에 갔을 때는 마침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때였습니다. 아래 밥집에서 점심을 먹고 선생님 집에 올라가니 그때서야 점심을 드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흙으로 빚은 물 잔에 죽을 담아서 드시고 계셨어요. 들여다보니 아직 반 정도 드셨어요. 속이 안 좋으셔서 죽을 드시고 계시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밥그릇도 아닌 흙으로 거칠게 빚은 물 잔에 담아 드시는 게 안돼 보였어요.
"좀 큰 밥그릇에 담아서 많이 드시지 고만큼 드시고 되시겠어요?"
선생님은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들고 있는 흙잔을 가만히 보시더니 느릿느릿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음, 이게 참 편리해요. 한 끼에 딱 요만큼 먹으면 속이 편해요. 나한테 딱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고 있기도 좋고, 손으로 감싸면 손 안에 쏙 들어와요. 참 편하고 좋아요. 이게 예술이지요. 안 그래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지요. 청자가 예술이 아니에요. 보고 구경하는 청자보다 이렇게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릇이 진짜 예술이에요."
천천히 죽 한 숟갈 떠서 드시고 좀 쉬었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몇 번 쉬었다 이어서 하신 말슴을 되살려서 간추린 말이에요. 같은 흙으로 빚었어도 부잣집에서 거실에 구경거리로 놓아두는 청자보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마시기에 편리하게 만든 물 잔이 더 소중한 물건이고, 그렇듯 여러 사람들 생활에 쓰기 좋은 물건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과천에 사실 때 집에 갔더니 과일 껍질을 따로 모아놓으셔요. 선생님 집에 가면 과일을 깍아주시는데, 초승달처럼 조금 휘처진 주머니칼로 깎아주시리 때가 많았어요. 과일을 제가 깎겠다고 해도 칼을 내주지 않고 굳이 손수 깎으셨어요. 어느 날인가는 제가 깎겠다고 했더니 주셨는데, 제가 깎는 모습을 보더니 조금 화난 목소리로,
"이 선생님, 그렇게 깎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과일도 못 깎아요?"
하시면서 칼을 도로 빼앗아 가시는 거에요. 저도 사과는 좀 잘 깎는다고 생각했고, 학급에서 사과 깎기 대회를 할 때는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여서 박수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과도 못 깎는다고 야단맞으니 좀 무안하기도 하고 속도 상한 마음으로 선생님이 깎는 모습을 가만히 보았어요. 제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도 좀 미안하셨던지 웃으시면서,
"이 칼은 내 손에 맞는 칼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깎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사과 껍질을 이렇게 얇게 멋겨야지요. 이 선생은 너무 두껍게 멋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깎아 놓으신 껍질을 보니 정말 얇으면서도 고른데, 제가 깎았던 껍질을 조금 두꺼운데도 있고 얇은 데도 있어 고르지가 못해요. 그냥 보기에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선생님은 그 작은 차이를 사과 껍질 두 세줄 깎았는데도 대뜸 알아보시고 속이 불편하셨떤 거예요.
다 깎은 사과 껍질도 옆에 모아놓은 과일 껍질에 모아두였어요. 가만 생각하니 우리 집 같으면 옥상에 작은 밭이라도 있으니까 모았다가 거름으로 쓰기도 하지만 과천 선생님 집에는 그런 밭도 없는데 왜 모으실까 궁금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과일 겁질을 왜 모아서 말리세요? 여기 어디 쓸데가 있어요?"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잖아요. 쓰레기가 되니까. 이렇게 말려서 두었다가 시골에 갈 때 갖고 가서 버리면 좋잖아요."
"언제 간다고 그러세요, 귀찮게. 또 시골 갖고 간다고 아무 데나 버릴 수도 없잖아요."
"(충주)무너미에 갖고 가 밭에 버릴 때도 있고, 산에 갖다 버려도 돼요. 누가 그렇게 많이 갖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 산에 갖다 두면 작은 짐승들이 먹잖아요. 겨울에는 먹을 것도 잘 없을 텐데."
그 다음에도 가끔 가보면 과일껍질 모아서 말리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사과껍질, 감껍질, 배껍질을 깎으실 때도 조금이라도 버리는 게 조금 나오도록 정성스럽게 깎으시고, 그렇게 깎은 껍질도 아무렇게나 쓰레기로 버리지 않으려고 하셨지요.
이오덕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가장 놀랐던 것은 일기였습니다. 일기를 꾸준히 쓰신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쓰셨고, 겪으신 일을 그렇게 자세히 쓰시는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읽은 일기는 1960년대부터 1995년도까지입니다. 아직 1996년부터 2003년 돌아가실 때까지는 못 읽었어요. 돌아가시는 날도 손바닥만 한 수첩에 글을 쓰셨으니 참 대단하지요. 일기장은 손바닥만 한 수첩에서 큰 공책까지 종류나 모양이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일기장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빼곡하게 써 놓았어요. 아래 위 빈자리까지 쓴 날이 많아요. 그 일기를 읽으면서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 일기를 쓰실 무렵 하신 말씀이나 행동이 이해가 갔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때도 하루에 서너 장을 빼곡하게 쓰셨는데, 데모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써 놓으셨어요. 곰곰 생각해 보니, 그날 저도 만났던 날인데, 다른 분들하고 가시는 걸 보고도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같이 가지 못하고 헤어졌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분들과 헤어지는 바람에 혼자 다니면서 두려웠던 마음을 솔직하게 써 놓으신 일기를 읽으면서 참 죄송했습니다.그날 내가 같이 모시고 갔으면 호낮 다니지 않을셨을 텐데, 하는 마음에요.
또 1991년에 제가 '글쓰기 회'에서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저한테 화가 나셨던 마음을 자세히 써 놓으셨어요. 그 글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까지 속이 상하시고 화가 나셨으면서도, 그리고 나중에 제가 잘못한 게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용서해 주셨구나'하는 생각 때문이지요. 선생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드렸는데도 나중에 제가 정말 용서를 빌고 그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17년이나 지난 2007년에 '글쓰기 회' 이사회에 안건으로 내서 그 일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게 했습니다.
이오덕 선생님은 참 부족하고 모자라기 짝이 없는 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둔한 저는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입니다.
이주영
서울 마포초등학교 교감.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계간 <어린이 문학>을 편집하고 있다.
<백창우
아저씨네 노래창고 이오덕 노래상자 '노래처럼 살고 싶어' 14~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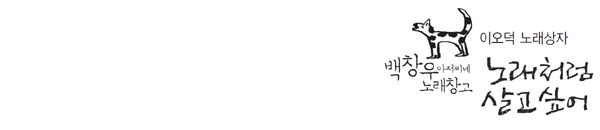









댓글을 남겨주세요
※ 로그인 후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